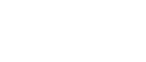"그래, 내가 그리 전했다."
그 모든 시간을 넘어 우리는 이기리라고.


NAME
ASTRAY NAME
CLASS
BIRTH
AGE · HEIGHT
GENDER
아르케네이아
패왕
리토네
칼리움 · 에흐게니아
640 · 179cm
안드로진
아스트로넛(@Aschannn_cmms)님 커미션



1
외관

여기, 몰락의 시대를 건너 그가 먼지바람과 낡은 영광을 끌고 걸어들어온다.
설마 너희가 나를 잊었느냐? 외치는 대신 호탕한 어조로 묻는다. 쩌렁쩌렁하던 음성을 기대했다면 당신은 조금 의아한 눈으로 그를 돌아보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알다시피 그 음성은 이제 어떤 전사도 무릎꿇리지 못하고, 옛 통치자의 위엄이나 가장 강한 자라고 불리던 이의 위용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한낱 인간, 어쩌면 지나치게 오만했던 인간 그 하나뿐. 꼿꼿하게 세운 허리, 턱을 치켜들고 쏘아보는 눈. 기어이 사그라들기 시작한 전성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형하고, 어쩌면 옛날 이 나이였을 때보다 더욱 정정해 보이기도 한다. 노화와 죽음이 평등하게 그를 얽어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느리게 쇠락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그가 조금은 더 삶에 가까운 탓인가…역설적이게도, 수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버림받는 이 시대에서야 비로소. 작열하는 태양 아래 어둡게 그을린 피부, 등 뒤로 늘어뜨린 백발. 조금 도드라지는 이마는 둥글게 마무리되고, 그 아래로 힘주어 그은 일획 같은 콧날이 이어진다. 깊게 들어간 안와 안의 눈매는 기세 좋게 치솟았고, 입술은 얇되 윤곽이 분명하다. 하나부터 열까지 유난히 또렷하고 선명하며 사납게 빚어진 이목구비 안에서 짐승 같은 금안이 한 차례 번뜩인다. 썩어도 준치라고, 그 얼굴에 여전히 희미하게 매달려 있는 피로와 시간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그 눈빛만은 여전히, 어떤 고집을 그득히 품고서 그 사이에 버티고 있는 것이다….
차라리 오기라고 해야 좋을는지도 모른다. 이유인즉, 그 이마 한가운데에 이제는 명확한 죄인의 낙인으로서 새겨진 하나의 십자 표식 때문에. 옛날에 그는 그것을 가리고 싶어했으나, 그것이 불신자의 증명이 된 지금 그는 도리어 그것이 더 당당하고 유쾌하다. 수치를 느낄 줄 모르는 인간이니 눈 마주친 순간 표식 역시 같이 당신의 시야에 담긴다. 가리지 않으니 이전보다도 선명해 보인다.
해서, 그는 이전보다 스스로가 강하다고 믿고 그에 따라 스스로를 무장할 수단을 얼마간 내려놓았다. 이른바 치장이라는 허영인데, 여전하기는 하나 이전에 비하면 보다 절제된 구석이 있다. 모래와 열기 위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겐 익숙한 희고 가벼운 천을, 제법 마르긴 했어도 여즉 단단한 몸체 위로 정갈히 두른다. 금속을 새끼줄처럼 꼬아 무릎 아래부터 발목까지 단단히 여미는 샌들을 신고, 머리에는 덩굴 같은 금을 썼다. 천을 고정하며 길게 늘어뜨린 금붙이들, 손가락에는 보석 박힌 반지 두어 개. 팔다리를 감싸는 황금 장신구들이 걸을 때마다 찰랑, 탁…소리를 내며 이어진다. 하나같이 정교하고 우아하며, 대부분의 이들에게는 이것이 과연 절제된 것이 맞는지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살아감에 있어 그는 언제나 부족한 사람보다는 넘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고 있으므로 이 정도면 그의 미학에 거슬리지 않는 최소한의 선이다. 후안무치한 인간인 것이야 설명하지 않아도 당신이 이미 알고 있을 것이나, 구태여 변명할 말을 하나 찾자면 그렇게 두른 것들을 지난 몇 년간 많은 이들에게 떼어 나누었다는 것일까.
그럼에도 여전히 이 자가 누구인지 모르겠거든 오른손에 들린 것을 보라. 제 키를 쉽게 뛰어넘는 거대한 하나의 창. 철을 몇 번이고 두들겨 희게 모양을 잡아낸 우아한 맵시다. 이름하여 레기온, 세 번의 백 년을 채우고 어느 날 홀연히 왕좌를 버린 옛 파디샤, 그의 반려 된 무기. 그가 창을 땅에 짚으며 당신을 향해 웃는다. 그래, 내가 그리 전하라고 말했다. 아르케네이아가 너희를 찾았으니,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2
신성
패전
그러나 무너져가는 세상에서, 패전이란 곧 응전의 증거다.
그의 손에 쥔 모든 무기는 이제 피부를 찢고 살을 가르는 대신 상처를 메운다. 창을 한 번 휘두르면 흐르던 피가 멎고, 도끼를 두 번 내리찍을 때는 새살이 돋으며, 검을 세 번 내지를 적에는 도리어 생기를 북돋는다. 마치 제가 지금껏 남긴 수많은 상흔을 도로 거두어 가는 것과 같이. 그리하여 신성의 활용은 실로 간단하다. 그저 지금껏 수도 없이 해 온 것처럼, 제 무기를 들고 전장에 나서 필요한 곳에 무기를 휘둘러 보이면 그것으로 아군을 낫게 할 수 있다. 우습게도 무기 다루는 실력은 여전하여, 혼란한 전장에서도 필요한 자와 필요한 때를 곧잘 찾는다. 그러니 그와 함께할 때에는 등 뒤에서 엄습하는 창날이나, 찌를 듯 쇄도하는 검끝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한다. 그것은 결코 사람을 해치지 못하고, 단지 자신이 지금까지 한 바를 돌이켜 담을 뿐이니.
다만 다행이라고 할 만한 사실 하나, 이 신성이 마수를 상대로는 다소 다르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신의 사랑 받지 못한 존재라 베지 말라는 금제에서도 예외가 된 것인지, 기묘하게도 마수를 향해 휘두르는 무기는 제대로 된 유효타를 낸다. 더하여 그간 마치 수복한 상처를 도로 뱉어내듯 한 번의 검격에 수십의 상처를 내고 상처에서 피 멎지 않게 하며 기력마저 쇠하게 하니, 단지 그가 꺾어야 할 것이 마수 하나뿐이었던들 도리어 일전보다 더한 영웅이 될 수도 있었겠다. 물론 아르케네이아 본인은 그런 말을 듣거든 대노하여 곧장 창을 휘두르겠지만, 그 상대가 사람인 이상 베기는커녕 생채기 하나까지 말끔히 낫게 해 줄 따름.
그러나 그가 이 신성을 마음에 들어하는 유일한 부분은, 이 위의 모든 설명과 무관하다. ‘신의 사랑에서 벗어난’ 것을 베어넘긴다던 믿음과 달리, 그의 창은 ‘불신자’를 회복하고 ‘언데드’를 벤다. 그 두 가지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것 ― 쉼없이 싸운 끝에 잠시 패배한 것과 영영 응전할 수 없는 것을 나누어 구분할 수 있는 것만큼 패왕의 마음에 흡족한 것이 있겠는가?
그러나 패전은 곧 응전의 증거이자 변하지 않는 삶의 의지라. 베어 넘기는 것과 상처를 메우는 것을 이제는 그의 뜻대로 행한다.
나침반
≪ 장창 레기온 ≫